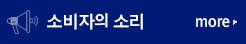최근 ‘토끼의 간’을 빼가는 식의 휴대전화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휴대전화를 훔쳐 파는 것이 아닌 유심칩을 다른 단말기에 이식해 막대한 온라인 결제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단말기가 먹통이 돼도 원인이 유심칩 도난이라는 걸 알기 어렵다. 결국 흘러가는 시간속에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문제는 이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유심칩을 훔치더라도 범인에게 물을 수 있는 죄는 절도죄가 전부인데다 부당한 결제에 대한 환불도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콘텐츠 결제에 한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환불 권한이 없는 콘텐츠 제조사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사 차원의 구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 씨의 사례처럼 절도를 당하더라도 통신사 입장에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책임을 물기 힘들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이동전화사업자는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제 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없다고 명시해 놨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입 단계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명의도용을 한 것이 아닌 절도사건이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보상은 없다”며 “다만 ARS인증, 소액결제와 관련한 안전장치가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현재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심칩 절도를 명의 도용으로 보기 힘든데다 절도사건의 책임을 사업자에 무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순히 유심을 절도해 결제를 한 경우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도 외에는 죄를 묻기 힘들다”며 “같은 이유로 피해구제도 통신사가 직접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심칩 절도 등 신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유심 절도의 경우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본인 인증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건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