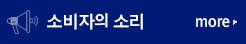오는 7일부터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지역이 모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와 미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 기존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한 서울지역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지난 달 말 청약한 은평구 불광동 현대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150여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하루 평균 문의 전화가 70∼100여통에 그쳤던 것에 비해 최고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출 범위와 전매제한 해제와 관련한 문의가 대부분"이라며 "분양가의 60%까지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계약과 동시에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일하이빌이 분양한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뉴시티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에도 전화 문의가 증가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모두 6억원을 초과해 종전까지 LTV 40%는 물론 DTI 규제도 받았다.
분양을 맡고 있는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분양을 받고 싶어도 DTI 때문에 대출이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입지여건이 괜찮은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계약을 이어진 곳은 많지 않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관심만 보일 뿐 선뜻 하겠다는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미분양 단지도 문의가 종전에 비해 조금 늘었다. 지난 6월 분양한 광주 오포 대림 e편한세상에는 "전매가 언제부터 가능하냐, 대출은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등의 관심 표명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 김포 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의 경우 최근 한달 새 계약이 거의 없다가 정부 대책이 예고된 지난 주말부터 4일까지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30여건이 계약됐다.
회사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졌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할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일 인천 청라지구에 분양한 호반 베르디움 620가구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고,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특히 개발 호재가 많으면서도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용산구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건설사에는 분양 일정이나 가격,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체크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여건이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들을 움직인 것은 확실하다"며 "건설사들도 분위기를 봐가며 수도권에서 미뤘던 사업들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완전히 되살아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대출 규제 등이 풀리면서 관심을 갖다가도 금리 인상이나 실물경제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실제 계약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용인 성복.신봉지구, 고양 식사.덕이지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7일 이후 매물로 나와 미분양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용인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해약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계약자들은 대부분 분양권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며 "7일 이후에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양권 이하의 손절매 매물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