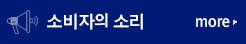영화에도 드라마에도 예고(teaser)편이 있다. 임팩트 있는 편집과 음악으로 시선을 사로잡아 본편의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 알음알음 입소문을 통해 뒷심을 발휘하는 작품이 없진 않지만 사실상 이런 행운을 누리는 일은 흔치 않으니 말이다.
매력적인 예고편, 광고 영상에 이끌려 본편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의 입에서 “예고편이 다였어”라거나 “예고편과는 전혀 딴판의 영화”라며 울분을 토하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잘 포장된 광고에 속아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벌어진다.
최근 폭발적이다 싶을 만큼 붐을 일으키는 유통 경로가 있다. 페이스 북 등 SNS로 요즘은 인*그램이 대세인 듯 싶다.
눈에 띄는 광고들은 주로 중소업체의 작품이다. 일반인들의 사용후기를 내세운 일반적인 상품부터 직접 제품을 만들었다는 제작자가 나서기도 하고, 소속 직원이 나서 제품을 의심하는 댓글에 직접 답하는 콘셉트까지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는 광고들이 SNS상에 즐비하다. 광고를 보고 있자면 이 신발을 신고 저 밑창만 깔아도 삐뚤어진 내 척추가 바로 서고 살까지 빠질 것 같다. 뿌려만 줘도 자외선을 차단 물론 백옥 같은 피부로 바꿔주는 화장품이라니...
혹시나 싶어 후기를 찾아본다.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았다’는 전문 블로거의 글을 걸러내고 나면 ‘실제 구매해 써보니 별반 효과 없다’는 글이 보인다. 이
글 역시 경쟁사가 남긴 글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싶다. 의심이 의심을 낳고 어느새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있다.
나 같은 소비자가 한 둘이 아닌 모양이다. 유통 채널이 다양해진만큼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었다.
특히 SNS에서 광고, 판매되는 상품을 구입했는데 전혀 다른 디자인과 색상, 재질의 옷이 배송됐다는 민원들이 줄을 잇는다.
하나 같이 광고 때와는 전혀 다른 사양의 제품이라는 내용인데 증거 사진을 보면 충격적 수준이다. 같은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판매자들의 배포가 가히 봉이 김선달 급이다.
일부 개인업자만의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껏 늘 경험해 왔다. 두 손으로 다 써도 잡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야채와 패티로 채워진 햄버거의 실제 모습은 광고사진과 다르다는 사실을, 커다란 새우가 마구 흩뿌려진 광고 사진 속 피자 역시 실제 상품과 똑같길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실제 상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대기업들은 공표(?)했고 우리는 암묵적 동의를 강요받아 왔다.
때문에 홈쇼핑에서 구매한 갈치의 토막이 턱 없이 작아도, 편의점 김밥 속이 부실해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했다.
대체 소비자는 '광고의 허위와 과장'을 결정하는 오차범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는 걸까?
이미 기업들과 판매자는 ‘상식’이라는 기준을 무너트린 지 오래인데 왜 소비자만이 그 모호한 기준을 붙잡고 감내해야 하는 건지 싶어 답답하기만 하다.
SNS라는 활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업체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꾸준히 노력해 온 중소업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할수록 소비자들 역시 비교, 선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다만 그 전에 상품에 없는 성능과 사양을 내세워 허위과대 광고 중인 일부 대기업과 판매자 분들에게 상식선의 페어플레이를 부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일까?
결국은 누구나 소비자다. '내로남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닐까.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취재부장]
[데스크칼럼]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는 얼마나 참아야 할까?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19.05.28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