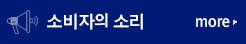김봉투 기자가 해외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잠깐 출근했다가 공항으로 달려갈 예정이었다. 퇴근 준비를 하는데 신문사 데스크가 김봉투 기자를 불렀다. 데스크는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리고 씩 웃었다.
김봉투 기자가 해외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잠깐 출근했다가 공항으로 달려갈 예정이었다. 퇴근 준비를 하는데 신문사 데스크가 김봉투 기자를 불렀다. 데스크는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리고 씩 웃었다.
"열흘 동안 비행기 탄다고 했지. 자, '꽃값'에 보태라구."
봉투 속에는 '일금 100달러'가 들어 있었다. 아마도 데스크가 언젠가 해외출장 갔다가 남긴 '달러'일 것이다. 선배 기자인 데스크가 후배 기자인 김봉투 기자에게 주는 '낑'이었다. 신문사 일은 잊어버리고 마음껏 놀다가 오라는 '낑'이었다.
다른 선배 기자도 김봉투 기자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역시 '꽃값'에 보태라고 했다. "선배들 덕분에 '꽃'을 너무 밝히다가 힘이 빠져서 귀국도 하지 못하겠다"며 낄낄거렸다.
물론 신문사에서는 출장비를 한푼도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김봉투 기자는 '출입처 낑'에다 선배 기자가 주는 '낑'까지 보태서 챙겨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출국할 수 있었다. 좋은 신문사였다. 후배 기자에게 '꽃값' 보태줄 정도로 '낑'이 풍성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김봉투 기자는 선배 기자가 준 '낑'을 '꽃값'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선배 기자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이를테면 '명령불복종'이다.
그 대신 '낑'으로 선배 기자들에게 '바칠' 선물을 샀다. 선배 기자들이 준 '낑'에 달러를 조금 더 보태서 사거나, 최소한 그 '낑'만큼 가격이 나가는 선물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제법 그럴 듯한 선물을 들고 귀국한 것이다.
선배 기자는 후배 기자를 각별하게 생각해줬다. '꽃값'까지 줬다. 그런 선배 기자에게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선물조차 하지 않으면 염치없는 기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귀국선물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했다. 예의였다.
더구나 공짜 여행에, 공짜 구경을 마음껏 즐긴 데다가 주머니까지 두둑했다. 그러니 선물이 없을 수 없었다.
김봉투 기자는 귀국을 앞두고 선물을 해야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보았다. 신문사 부장, 차장, 선배, 동기생, 후배 등등을 차례차례 꼽아봤다. 모두에게 선물을 하려면 아마도 돈이 간단치 않게 들 것이었다.
아내와, 아이들 선물도 빠뜨릴 수 없었다. 아이들은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까지 이미 '예약'해놓고 있었다. 아내에게서도 이것저것 있으면 좋겠다는 '압력'을 좀 받아놓고 있었다.
명단에서 빠지면 안 될 사람은 또 있었다. 공짜 여행을 시켜준 '출입처'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출입처의 기관장과 홍보실장에게는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비행기표값에, 여비까지 지급해준 출입처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명단을 만들어보니 순식간에 20∼30명이나 되었다.
게다가 김봉투 기자가 개인적으로 쓸 물건도 몇 가지 고를 생각이었다. 카메라는 출국하자마자 동료 기자들과 똑같은 것을 사서 걸치고 다녔지만, 그것 외에도 필요한 게 제법 있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한 김봉투 기자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쇼핑센터와 백화점 등을 몰려다녔다. 기자들은 저마다 적지 않은 선물을 사들였다. 한 기자가 어떤 선물을 사면, 다른 기자도 덩달아 샀다. 또 다른 기자도 똑같은 것을 샀다.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샀다. 그 바람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상품은 한꺼번에 몇 십 개씩 줄어들었다. 기자들은 필요 이상의 선물을 사고 말았다.
'싹쓸이 쇼핑'을 자제하자는 기사를 거의 외울 정도로 열심히 썼던 기자들이다. 하지만 기사와 실제 행동은 달랐다. 더구나 지갑에는 '달러'가 잔뜩 들어 있었다. 기자들은 '싹쓸이 흉내'를 열심히 냈다. 쇼핑에 들어간 돈을 모두 합치면 상당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자기 돈을 내고 물건을 산 기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파트너' 값 외에는 돈 쓸 일이 거의 없는 해외출장이었다. 두둑한 '낑'은 물건을 살 때나 필요한 것이었다.
미국의 여행 전문 사이트가 세계 10대 '쇼핑 도시'라는 것을 발표했었다. 1위는 방콕, 2위 부에노스아이레스, 3위 코펜하겐, 4위 홍콩, 5위 런던, 6위 로스앤젤레스, 7위 마라케시(모로코), 8위 뉴욕, 9위 파리, 10위는 프랑스령 카리브해 세인트바츠로 되어 있었다. 김봉투 기자는 이 10대 '쇼핑 도시' 가운데 6개 도시에서 쇼핑을 즐긴 경험이 있다. 그것도 어지간한 규모의 쇼핑이었다.
선물도 자주 사다보니 요령이 생겼다. 가급적이면 부피가 적고, 그러면서도 비싼 것을 고르는 게 스스로 터득한 요령이었다. 그러면 가지고 다닐 때 짐이 덜 되고,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도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포장을 뜯어버리는 것도 요령이었다. 선물을 한 보따리 사서 숙소인 호텔로 돌아오면 포장부터 뜯어버렸다. '뻥튀기' 포장이 심하다는 일본에서 선물을 샀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래야 부피가 줄어들어 짐이 간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가격표는 그대로 붙여뒀다. 제법 가격이 나간다는 '증명'까지 없애버릴 필요는 없었다.
출국할 때는 짐이 간단했다. 조그만 여행가방에 든 세면도구가 전부였다. 하지만 선물을 사다보면 큰 가방이 필요했다. 귀국할 때는 큰 가방이 3∼4개로 늘어났다. 그렇게 산 가방이 제법 많았다. 그러나 귀국하고 나면 쓸데없는 가방이 되곤 했다.
그러고 나서도 할 일이 또 있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신문사로 국제전화를 하는 일이다. '공항 출입기자'에게 언제, 어떤 비행기편으로 귀국한다고 연락해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항에서 '짐 검사'를 받지 않고도 넘어갔다. '공항 출입기자'의 '끗발'이었다. '무관의 제왕'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귀국하는데 '짐 검사'를 받는 귀찮은 일은 없어야 했다. '무관의 제왕'은 출국할 때도, 귀국할 때도 '무사통과'해야 정상이다.
짐 검사 따위는 일반 승객이나 받는 것이다. 짐 가방이 몇 개나 되더라도 '무관의 제왕'에게는 검사가 필요 없었다. 김봉투 기자는 가방을 3∼4개나 개나 들고도, '무사통과'하곤 했다. 일반 승객의 눈초리는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도 '짐 검사'에 걸리는 기자가 어쩌다 있었다. 어떤 기자는 호화 골프채 세트를 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되었다. '공항 출입기자'를 동원해서 어물쩍 넘기기는 했지만, 망신을 당해야 했다. '언론업계'에 소문이 파다했다.
김봉투 기자는 그 많은 쇼핑을 하면서도 '달러'가 모자라는 일은 없었다. '낑'이 항상 충분했기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