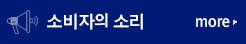‘중국산 없이 하루 살아 봤더니(A day without made in China).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팔던 불량 식품 기억하는가? ‘쫀드기’ ‘달고나’ ‘아폴로’ 등. 싸고 자극적인 맛으로 연방 유혹하던 불량 식품 때문에 혼나지 않은 어린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웰빙 열풍이 불면서 불량 식품들은 이제 추억의 제품으로 남았다.
이제 불량 제품, 저가 제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단어는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다. 과거 불량 식품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산 제품들은 싼 가격과 많은 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의 한 여기자는 집안을 점령한 중국산 제품 없이 1년을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일년 후 결론은 ‘중국산 없이는 못살아’였다. 그리고 이를 ‘A year without made in China’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정말, 중국산 없이 살 수 없는 건지 ‘중국산 없는 하루(a day without made in china)’를 체험해 봤다.
▶오전 5시30분 기상=7월 31일. 오전 5시30분. 눈을 뜨면서부터 전쟁은 시작됐다. 메이드인 차이나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는데 하루를 이들 제품 없이 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에서 쥐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은 다른 데 있었다. 샤워를 하기 위해 샴푸, 린스 등이 어디에서 제조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앞면, 뒷면, 밑부분을 모두 뒤져보아도 도대체 이 제품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원재료가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중국산 제품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상황인 셈.
출근을 위해 옷을 입으려고 하자 그제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Made in China와의 전쟁은 곧 옷과의 전쟁이었다. 도대체 중국산이 아닌 옷이 없다. 싸게 산 옷부터 고급 옷까지 모두 중국산이었다. 옷의 라벨을 뒤지고 뒤지다 지치기 시작했다. ‘만약 오늘 하루 모든 사람에게 메이드인 차이나 옷을 못 입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마 절반쯤은 옷을 벗고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는 옷이나 신발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나올 것이고, 양복이 없어 출근 못 하는 직장인도 숱할 것이다.
의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의류 브랜드는 중국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많은 생산지를 가지고 있는데 중저가를 지향한다면 이들 지역에서의 생산 비율이 높고, 고급을 지향한다면 덜한 편이다. 전 세계 어떤 패션 브랜드든 다 자국 내에서 생산라인을 가진 데는 없다. 루이뷔통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보통 20~30% 정도의 고급 브랜드가 중국에서 생산, 중저가의 90%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이뷔통, 버버리마저도 made in China 물결에 동참하는 중이다.
▶오전 6시40분=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노트북을 열고 e-메일을 확인하는 것. 하지만 오늘은 노트북을 엎어놓고 라벨 확인부터 시작했다. 직업적 특성상 거의 하루 종일 노트북과 핸드북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만약 중국산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됐다.
삼성 센스X11 노트북 뒷면 라벨에는 똑똑히 Made in China라고 쓰여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컴팩(compaq)의 노트북용 마우스에도 Product of China라고 기재돼 있다. 배터리는 리신㈜ 제조에, 판매만 삼성전자다.
삼성 홍보팀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삼성 노트북은 모두 34만대. 지금까지의 누적 판매량으로 본다면 몇백만명이 중국산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셈이고, 모두 사용 금지시킨다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것이다. 삼성은 노트북 생산라인이 중국밖에 없어서 삼성 노트북은 모두 Made in China 딱지를 달고 들어온다. 하지만 노트북을 해부해보면 엄밀히 중국산이라고 할 수 없다. 배터리 셀은 삼성SDI에서, CPU메모리는 인텔에서, 메모리는 삼성반도체에서 만든다. 숱한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도 이탈리아, 파리에서 생산한 것과 똑같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는 “원산지만 중국으로 돼 있을 뿐입니다. 생산을 담당하는 법인이 중국에 있고, 그 법인 관리를 삼성에서 합니다. 중국에는 현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삼성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뉴얼과 관리, 제조 방식은 모두 한국과 동일합니다. 다만 생산을 중국이라는 땅을 빌려 하는 것뿐입니다”고 전했다.
▶오전 8시30분 근무 중=이른 근무로 출출한 참에 옆 선배가 과자를 하나 건네준다. 크래프트(kraft)사의 오레오 초콜릿 웨하스 스틱이다. 이런, 그런데 나비스코 사가 제조했고, 원산지는 역시나 중국이다. 배는 고프지만 먹을 수가 없다. 게다가 노트북을 쓸 수 없으니 거의 원시인이 된 기분이다. 중요한 소식들이 메일 함에 들어와 있을 듯한 기분에 불안과 조바심은 더해진다. 웹 금단증상이 시작됐다.
▶오전 11시30분 점심식사=회사 근처에 있는 K식당에 들렀다. 아주머니가 반찬을 내오기 시작했다. 김치를 발견하자 궁금증이 먼저 일기 시작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의 국내 시장 공략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2001년 19만5000달러였던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2006년 8793만5905달러로 무려 5년만에 450배가량 증가했다.
“아줌마, 이 김치 중국산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산만 써요.”
“그럼 이거 한국 배추에요?”
“아이고, 아가씨. 요새 한국 배추가 어딨어. 그냥 다들 한국산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먹는 거지. 그래도 중국 배추, 고춧가루 뭐 이런 거 다 빼면 장사 못해.”
배추에 “나 중국산이요, 나 한국산이요”라고 쓰여 있기 전까지는 배추의 국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듯했다.
▶오후 2시= 내 핸드폰은 LG싸이언 샤인폰. 배터리, 본체 모두 Made in Korea인 덕분에 나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후쯤 되니 많은 통화량 때문에 핸드폰이 방전됐다. 충전기를 꺼냈더니 영락없이 Made in China다. 핸드폰도 꺼져 버리고 이제 꼼짝없이 무기 없이 전장에 나간 병사 꼴이다. 이제는 답답함을 넘어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오후 4시=기사 작성을 위해 광화문에 있는 한 PC방에 들렀다. 그런데 LG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마우스들이 모두 또 중국산이다. 어쩔 수 없이 다시 PC방에서 나왔다.
▶오후 8시=화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인기드라마 ‘커피프린스’를 챙겨본다. 보통은 노트북으로 딴 짓을 하면서 on-air 서비스로 보지만 오늘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다.
고로 텔레비전을 켜려고 보니, 대우의 제품인 텔레비전 역시 중국에서 생산된 것. TV 보기를 포기하고 얌전히 앉아 있는데, 열대야 현상 때문인지 집안이 후끈거린다. 선풍기를 켜려고 보니 신일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든 선풍기도 역시나 중국산. 그저 땀만 뻘뻘 흘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겨우 하루를 중국산 제품과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단 증상은 심각했다.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고, 핸드폰을 충전시킬 수 없어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중국에서 가봉된 옷을 제외하고 나니 입을 수 있는 옷도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너무 고생스러워 중국 선전에 살고 있는 친구 염방(여?26)에게 물었다.
“메이드인차이나를 빼니까 하루 종일 살 수가 없더라. 중국이라면 어떨까? Made in Korea를 빼고 하루를 보낸다면?” 돌아오는 대답은 간단했다.
“글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제품은 옷 한두 개, 그리고 화장품 한두 개뿐이야. 요즘 한국 옷을 중국에 가져다 되파는 게 유행이거든. 하지만 생활에서 불편은 없을 것 같아. 하루가 아니라 일년이라도.”
만약 Made in China 제품들이 평소에 툭 하고 자주 고장이 났던 불량제품이었다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산 제품들이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매뉴얼대로 생산된 중국산 제품의 질 역시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글로벌화 되면 될수록 ‘중국산 없이 살 수 없는 나’와 ‘한국산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중국 친구’ 사이에 깊은 거리감이 느껴진 하루였다.
김선희 기자(sunny@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