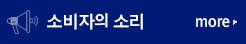#. 경기도에 사는 박 모(여)씨는 2023년 다리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50만 원 가량의 의료비를 지불했다. 박 씨는 가입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치료비만큼의 보험금을 받았다. 얼마 후 박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67만 원 가량의 환급금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연락 와선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보험사에서 지원금을 얼마 받았냐고 묻더니 그만큼 돈을 반환해야 한다더라"며 "10년 넘게 매달 2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살았는데 보험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분노했다.
실손보험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한 보험사의 환수 진행에 동의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 불만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표준약관 이전의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부담금은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공단의 환급금에 대한 보험금 환수에 동의하지 않을 시 향후 다른 청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마저 거절하고 있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 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보험사의 환수 진행에 동의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공단의 환급금만큼 돌려 달라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반복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8년 도입한 제도다. 소비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 주고 있다. 소득수준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등급별로 나뉜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병원에서 치료 후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된 후 국가에서 초과된 치료비를 환급해 주자 보험사들은 이미 지급됐던 보험금 중 공단에서 지급한 환급금만큼 보험금을 환수하고 있다. 실손보험이란 실제 일어난 손해만큼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건 국민건강보호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속한다. 그러나 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은 실손보험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해당 약관은 표준약관에 기재돼 있다. 대법원 또한 사후환급 문제에 대해 법률상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받았다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보험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분쟁은 2009년 표준약관 이전 약관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표준약관 이전 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표준약관 이전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분쟁에서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례는 보험사 측에서 2008년 11월 27일 실손보험 가입자의 사후환급이 110만 원 가량으로 책정될 것으로 추정하며 계약자를 보험금 부지급 대상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계약자가 실손보험 특약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들은 국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인데 보험사의 이익만 채워 주는 것이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보험사들은 손해보험 원칙상 공단에서 지급한 초과분에 대해서까지 실손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손해보험의 전제 중 하나가 이득 금지의 원칙이고 보험은 결국 실질적으로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이다"라며 "국가에서 해결한 비용까지 실손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의 유리한 판결에도 보험사들은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됐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보험사들은 지급했던 보험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비자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계약자의 소득 수준을 알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 서류를 받아야 하고 이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로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소비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추후 공단의 환수액에 대해 반환하라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았으나 최근엔 아예 공단 초과분에 대한 보험사의 환수 진행에 동의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로 바뀌게 됐다.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서류 열람에 대해 동의한 고객들에 한해서 전년도 전전년도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어 환수액을 추정하고 있다"며 "상한제에 걸릴 것 같은 고객이 확인되면 공단의 초과분을 제한 보험금만 지급될 거라고 사전에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선 위임장 등 확인서를 받은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