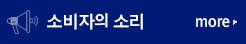젊은이는 광평의 손에 치도곤을 당한 동료들의 횡액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고 있었다. 뒤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자의 얼굴까지 돌려 세운 채 연신 입을 찾고 있었다. 여자는 그런 그의 입을 세차게 빨아대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다. 심지어 양 손으로는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고 있었다. 강간이 아니라 완벽한 화간(和姦)이었다.
백주(白晝)는 아니었어도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통에서 펼쳐진 두사람의 농염한 변태적 정사는 바로 끝나지 않았다. 젊은이의 지구력은 어린 나이치고는 보통이 아니었다. 애가 탄 것은 여자의 애인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현장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낯 뜨거운 현장으로 곧장 달려들어 둘을 뜯어말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 역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약 5분쯤 후 젊은이와 여자가 듣는 사람이 낯부끄러울 수준의 단말마에 가까운 비명을 내질렀다. 둘의 몸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오차에 이른 것이 확실했다.
광평은 젊은이를 마지막으로 손 봐 주기 위해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하지만 굳이 그가 손을 쓸 필요는 없었다. 눈 뻔히 뜨고 애인의 봉변을 지켜본 남자가 분노와 질투의 감정이 머리 끝까지 치밀었는지 젊은이의 얼굴을 죽어라 하고 몇 번이나 강하게 걷어찬 것이다. 젊은이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큰 대자로 대로에 그대로 누워버렸다. 천국에서 지옥으로라는 말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따로 없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광평이 제 정신으로 돌아온 여자에게 눈길을 보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변태적 성 행위를 했다는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 컸을까, 남자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고 있었다. 하기야 그녀로서는 본능에 의해 이성이 여지 없이 와르르 무너진 것에 대한 회한도 적지 않을 터였다.
"무슨 일로 봉변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빨리 피하도록 해요. 보아 하니 경찰이 오는 것도 달가워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광평이 문호를 부축한 다음 몰골이 말이 아닌 두 남녀에게 일렀다. 거의 입기가 불가능해져버린 여자의 치마와 속옷을 건네면서였다. 두 남녀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둥야 호텔 저쪽의 큰 길로 멀어져 갔다.
"이 사람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를 뻔했군. 앞으로는 웬만하면 남의 일에 끼여들지 말라구. 타이완 폭력배들을 몰라서 그래? 아무튼 오늘 이후로는 조심해. 기분도 그렇고 하니 다시 들어가서 남은 술이나 다 마시자구."
광평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을 툭툭 털고 만두집으로 몸을 돌렸다. 문호도 광평의 뒤를 따랐다.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봐서는 짧은 머리에게 맞은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야, 자네 정말 대단한데.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줄은 몰랐어. 밑천 못 건지는 공부 그만두고 아예 그 방면으로 나가도 되겠는걸. 나이는 좀 먹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고쳐먹는게 어때. 도장 하나 차리면 호구지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잘하면 장가도 가고."
다시 만두집으로 되돌아와 자리에 걸터앉은 문호가 광평을 한껏 추겨 세웠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표정이 아주 진지했다.
"이 친구야, 그러려고 마음먹었으면 진즉에 그 길로 나섰어. 자네, 우리 아버지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내가 박사가 되는 거였다고. 할아버지나 아버지 모두 무술에 일생을 걸었으니까 학문하는 사람이 부러웠던 게지. 머리가 나빠 아직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나는 폭력은 싫어.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끝마칠 거야.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다시는 그런 소리는 말라구. 그건 호스트 바를 다시 나가라는 것과 진배 없는 모욕이야, 나한테는. 자 술이나 마셔."
광평은 문호의 말을 일축하면서 맥주를 거푸 두잔이나 비웠다. 조금 전의 싸움이 마음에 몹시 걸리는 눈치였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상당히 취했다. 두 사람 모두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못할 정도였다. 문호는 계산을 끝낸 광평과 함께 만두집을 걸어나왔다.
시장통은 여전히 불빛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길 양쪽으로부터 거리를 좁혀들어오는 일단의 검은 그림자들을 취중에도 느낀 것은 모두 그 불빛 덕분이었다. 적게 잡아도 30여명은 됨직한 무리였다. 모두가 건장한 체구였다. 시먼딩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있는 폭력배들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주위에 그들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 누구를 노리고 다가오고 있는지도 분명한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