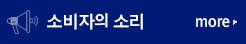주요 판매처였던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 담당 부서장이 상품 구조를 모를 정도로 복잡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안일한 판매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높은 H지수 ELS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션매도를 포함한 구조화 상품은 기관 위주로 판매하고 개인에게는 판매하면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은행에서는 판매를 중단해야하고 어렵다면 고객에게 불완전판매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은행들의 안일한 판매 스탠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대출을 강요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ELS 상품의 경우 고령자에게 판매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은행에서 가입한 피해자들은 정기적금 대체 상품인줄 알고 경로의존성에 따라 파생상품에 가입한 셈"이라며 "이들이 가입한 돈은 대부분 주택구입자금과 노후대책자금, 결혼자금 등 목적자금이었다"고 밝혔다.
현장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 산정과 배상 방침 등은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고 만기 도래 규모가 어느정도 나온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ELS 자체가 고난도 상품이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ELS는 파생상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소비자가 아니면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하는 상품"이라며 "작년부터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과 영업점에서의 판매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 정무위원들은 주된 판매창구였던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문제도 지적했다. 홍콩H지수 ELS의 변동성은 과거에도 수 차례 컸다는 점을 감안했어야한다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하지 못하면 비이자수익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ELS 판매 수수료가 5대 시중은행 전체 수수료 수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면서 "금융당국은 ELS 불판이 터질 때마다 현황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계속 발생했다는 점에 문제 의식이 있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금융당국 차원의 리스크 점검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22년까지는 개인투자자 관련 내용없이 증권사 건전성 저해 우려에 대한 내용만 있었다"면서 "건전성에만 올인하는 금융감독 업무에서 소비자보호를 구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현재 진행중인 판매사 현장검사를 비롯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용우 의원이 지적한) 풋옵션 매도는 위험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검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ELS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은 위험하다는 점에서 (ELS 은행 판매금지 여부 등) 종합적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각 은행들의 사후판매 모니터링 제도 등이 소비자보호의 실효적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형식적 절차는 제시하고 있는데 실효적 장치였는지 알아보고 있고 DLF 사태 이후 시행된 영업행위 규제나 모범규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