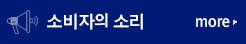비상구 좌석은 안전과 관계된 사안인 만큼 현장 직원의 판단을 우선한다는 것이 항공사 측 입장이다.
하지만 대형 항공기와 달리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사전 예약을 받는 상황에서 사전 안내된 규정과 달리 현장 직원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국제결혼으로 태국에서 살고 있는 정 모(여)씨는 웃돈을 주고 비상구 좌석을 발권했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10월 부모님을 보기 위해 한국행 제주항공을 이용한 정 씨는 가는 내내 좁은 좌석 탓에 불편해하던 시부모님이 마음에 걸렸다.
요금을 추가 지불하면 공간이 넓은 비상구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 씨는 예약 전 항공사 측에 이메일로 50대 초반의 태국인, 건강 상태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발권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며칠 뒤 국토교통부의 운항기술기준 내용을 보내왔고 해당되는 사안이 없다고 생각된 정 씨는 인당 1만6천 원씩을 추가로 지불하고 두 자리를 구매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날 공항에 도착한 정 씨 일행은 항공사 창구에서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들었다. 언어 사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인 사람만 비상구 좌석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
정 씨가 "이메일로 받아본 기준에는 국적 제한이 없다"고 따졌지만 결국 일반석으로 재배치됐다고. 직원은 추가 지불한 금액은 고객센터로 불만을 제기해 환불받으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사전에 충분히 문의까지 해서 예약을 했는데 발권 후 현장에서 자리가 재배치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항공사 직원 마음대로 결정해 조절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안전과 관계된 사안인 만큼 현장에서 직원이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발권 시 조건에 맞지 않는 승객이 발권했을 때를 대비해서다.
항공사 관계자는 "규정상 비상구 좌석에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앉을 수 없을뿐더러 승무원의 확인 보고 없이는 비행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들은 수익성 개선 차원으로 최대 2만 원을 추가해 비상구 좌석을 판매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비상구 좌석을 사전판매하지 않는다. 양사는 운항 당일 탑승객을 직접 확인한 후 자리 배정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